전문가 칼럼
'부채의 덫'에 빠진 미국…흔들리는 달러 패권[특파원 리포트]
- 연방정부 부채 급증에 달러 신뢰도 하락
국채 금리 0.5%p 오르면 미 정부 연간 이자부담 약 252조 증가
재정 정책 예측 가능성 높이고 일관성 유지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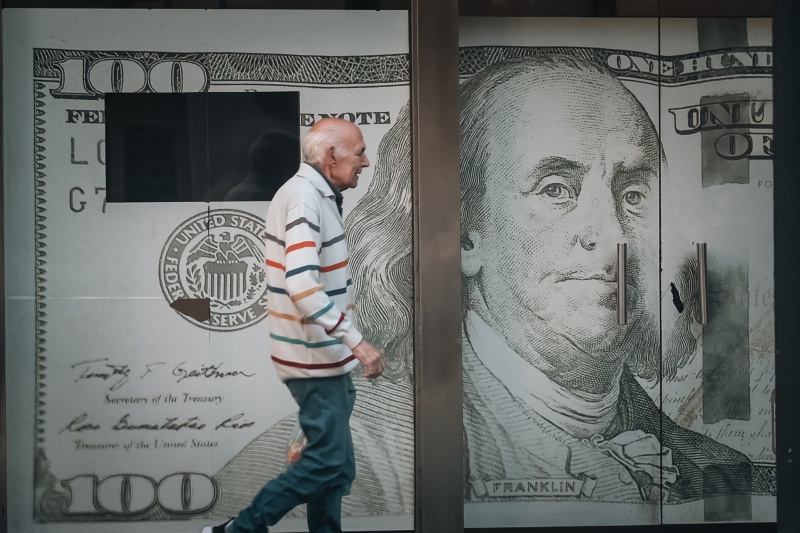
이데일리 미국과 중국 특파원이 현지에서 보고 느낀 생생한 경제·산업 분야의 이야기를 격주로 연재한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특파원] “미국은 달러를 찍어낼 수 있으니 디폴트 걱정은 없다.” 흔히들 생각하는 달러에 대한 ‘신화’다. 하지만 최근 국채금리 급등과 미국 신용등급 강등,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확대 흐름은 이같은 ‘신화’에 균열을 내고 있다. 달러가 여전히 세계 기축통화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 기반인 재정 건전성과 시장 신뢰에 의문이 커지면서 ‘달러 패권’이 흔들리고 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자국 통화로 이론상 무제한의 국채를 발행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다. 이는 달러가 국제무역의 88%, 글로벌 외환보유고의 59%를 차지하는 기축통화이기 때문이다. 미국 국채는 글로벌 중앙은행과 기관투자자들에게 여전히 ‘안전자산’으로 간주되며, 달러는 결제통화와 준비통화로 막강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국채 발행→ 연준 매입→ 달러 공급’ 매커니즘이 작동하며 미국 정부는 막대한 재정적자를 안고도 국채 발행을 통해 비교적 손쉽게 자금을 조달해 왔다.
달러 공급 매커니즘 고장…급증하는 연방정부 부채 탓
이 시스템은 전적으로 시장의 신뢰를 전제로 작동한다. 경제학자들은 “신뢰를 잃는 순간, 달러의 절대적인 수요도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 과거에는 ‘달러가 있으니 갚을 수 있다’는 신뢰가 미국 국채의 금리를 안정시켰지만, 지금은 그 신뢰가 흔들리는 것이다.
이 신뢰를 흔드는 가장 큰 요인은 급증하는 연방정부 부채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현재 누적 연방 부채는 36조2000억달러(약 5경730조원)에 달한다. 2019년 23조달러 수준이던 부채는 코로나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급증하며 5~6년 만에 13조달러 이상 증가했다. 2035년에는 59조2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미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120% 수준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치다. 팬데믹 대응을 위한 대규모 부양책과 세수 감소, 정치적 교착으로 인한 지출 통제가 부채 증가를 부채질했다.
더 큰 문제는 부채의 이자 부담이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에만 1조1300억 달러를 이자 상환에 지출했다. 이는 불과 몇 년 만에 두 배로 증가한 수치다. 이자 부담이 급증하면서 ‘이자 지불을 위한 국채 발행’이라는 악순환에 빠질 위험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부채규모는 더욱 커지고 이자지출은 다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어느 순간에는 국가가 부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적으로 악화할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된다.
미 의회예산국(CBO)과 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는 미국의 연방정부 부채가 GDP 대비 2024년 123.2%에서 2035년 134.8%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같은 기간 순이자 지출은 세입 대비 17.6%에서 21.8%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부채 증가 속도가 GDP 성장률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는 점이다. 향후 10년간 미국 실질 GDP는 연평균 1.8% 내외 성장에 그칠 것으로 보이지만, 총부채는 연 5~6%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현실화하면 미국의 재정 통제 능력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가 지속되면 시장은 국채에 대해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미국이 재정 적자·부채 감당에 실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 투자자들은 내 돈을 떼일 위험이 있으니 더 높은 수익률(프리미엄)를 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즉 미국이 부채 감당에 실패할 가능성이 커질수록 국채금리는 오르게 되고 이는 기업과 가계의 차입 비용을 증가시켜 실물경제 전반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해석이다. 미 정부 입장에서는 국채금리가 치솟으면 부채 이자비용이 더욱 불어나는 상황을 맞게 된다. 현재 36조달러에 이르는 연방 부채 규모를 감안하면, 금리가 0.5%포인트만 상승해도 산술적으로 새 국채를 발행할 때 미국 정부의 연간 이자 부담은 1800억달러(약 252조원) 늘어난다.
달러 패권에도 그림자가 드리운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국 자산에 대한 신뢰를 잃는다면,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는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달러에 대한 신뢰 약화는 자본유출과 외환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최고등급인 ‘Aaa’에서 ‘Aa1’으로 강등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무디스는 “재정적자와 정치적 불확실성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구조적 리스크”라며 “정치가 재정 정책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재정악화에도 밀어부치는 감세안…3.3조달러 부채 늘어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감세안을 다시 꺼내 들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Make America Great Again) 구호 아래, 관세·감세·규제완화라는 ‘엔진’을 통해 성장과 세수를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이 구상은 부채 구조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
현재 하원 공화당이 추진 중인 ‘크고 아름다운 법안(Big Beautiful Bill)’은 2017년 감세 연장을 포함해 총 3조3000억달러(약 4544조원)에 달하는 추가 부채를 야기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는 ▲팁·초과근무 소득에 대한 면세 ▲자동차 대출 이자비용의 비과세 ▲노인 세액공제 신설 등이 포함돼 있다. 뉴욕‧뉴저지‧캘리포니아 등 고세율 지역구 의원들의 요구가 반영된 SALT(주 및 지방세 공제) 한도 상향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재정 적자 확대를 관세수입과 정부 지출 효율화, 그리고 감세를 통한 경제활성화로 보완하겠다고 설명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재 구조상 부족분을 메우기엔 역부족”이라고 입을 모은다. 수십 년간 반복된 감세가 성장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은 검증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세수 감소와 부채 증가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미국의 달러 패권은 단순한 통화 발행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안정된 재정 ▲강한 생산성 ▲정치적 일관성, 그리고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 위에 구축된 체제다. 이 네 가지가 동시에 흔들릴 때 달러는 더 이상 ‘무적’이 아닐 수 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집 속에 삶이 있다… 유튜버 ‘자취남’ 재밌네 [김지혜의 ★튜브]](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5/07/isp20250507000059.400.0.jpg)
![약 5분 만에 인생꿀팁 알려드립니다 ‘비치키’ [김지혜의 ★ 튜브]](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4/27/isp20250427000053.400.0.jpg)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브랜드 미디어
브랜드 미디어
악재 속출에 ‘백종원 브랜드’ 매출액 20% 뚝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일간스포츠
이데일리
‘사망설 곤혹’ 액션스타 이연걸, 14년 만 中 무협영화 주연
대한민국 스포츠·연예의 살아있는 역사 일간스포츠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이렇게 얇은 폰은 처음!"…갤S25 엣지, 슬림폰 열풍 일으킬까[잇써봐]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데일리
[마켓인]모태펀드 존속 불확실성 해소될까…이재명 공약에 업계 주목
성공 투자의 동반자마켓인
마켓인
마켓인
[단독]지투지바이오, 특허무효심판 피소…상장 영향은?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