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지상은 지키고 지하를 열다…보존과 혁신의 조화[김현아의 시티라이프]
- [기술에서 전략으로]③
지하 공간 복합 기능 플랫폼으로 승인하는 제도적 변화 필요

[김현아 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 초빙교수·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전 국회의원] 도시는 성장의 국면에서만이 아니라 성숙의 단계에서도 새로운 공간을 갈망한다. 개발도상국의 도시들은 인구와 산업의 팽창에 대응하기 위해 초고층 빌딩을 세우며 하늘을 향한다. 하지만 고층 개발은 종종 오래된 거리와 역사적 경관을 훼손하거나 사라지게 만든다. 도시가 성숙기에 접어들면, 단순한 토지 활용을 넘어 과거의 건축과 장소성이 갖는 상징적 가치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이때 도시가 찾는 해법은 단순히 더 크게, 더 높게 짓는 방식이 아니다. 낡은 건축과 거리를 보존하면서도 새로운 기능을 담아내는 기술과 디자인이 필요하다. 여기에 지하공간도 빠질수 없다.
거리의 얼굴은 지상에, 활력의 무대는 지하에
도쿄 오모테산도는 이 전환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1919년 메이지 신궁 참배길로 만들어진 이 거리는 전후 미군 문화와 국제적 감각이 뒤섞이며 도쿄의 패션·예술의 중심지가 됐다. 이곳에 자리했던 도준카이 아파트(1927년 건립)는 근대 주거의 기념비적 건물이었지만, 세월과 함께 노후화되며 재건축 논의가 불가피해졌다.
안도 다다오가 설계한 오모테산도 힐스 프로젝트(2003~2006)는 단순히 한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에 그치지 않았다. 안도 다다오는 “도시의 원래 얼굴을 보존한다”는 철학 아래, 가로수와 경사에 순응하는 건물 높이, 낮은 파사드를 채택했다. 그러면서도 지하를 적극적으로 파고들어 지하 6개 층을 고급 상점, 레스토랑, 갤러리, 이벤트 공간으로 구성했다. 디벨로퍼인 모리빌딩(Mori Building Co., Ltd.)은 이를 통해 거리 경관을 유지하면서도 도심 속 새로운 에너지를 끌어낼 수 있었다.
더욱이 철거된 도준카이 아파트의 흔적을 기록·조사를 거쳐 일부가 ‘도준관’으로 재현된 점은 아주 특별하다. 새로운 건축물 안에 옛 건물의 기억을 물리적으로 남긴 이 시도는, 단순한 개발이 아닌 기억의 계승을 통한 도시 재창조라 할 만하다. 경관을 지키면서 지하에 활력을 더하는 방식은 당시 일본에서도 드문 시도였는데 오모테산도 힐스는 그 전환점이 됐다.
빛과 공기를 품은 지하 갤러리
미국 캔자스시티의 넬슨-애킨스 미술관은 본관이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지어진 기념비적 건물이었다. 인디애나 석회암으로 둘러싸인 중후한 외관과 최소한의 창문은 ‘예술의 신전’(Temple to Art)이라고 불릴 만큼 폐쇄적이고 장엄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며, 더 많은 전시 공간과 보다 개방적이고 유기적인 관람 경험에 대한 요구가 커졌다. 이러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건물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건축적 해법을 모색하는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아직도 진행중인 이 프로젝트의 출발은 건축가 스티븐 홀이 이를 맡았다. 출발은 확장의 중심, 블록 빌딩(Bloch Building, 1999~2007)의 건립이었다. 이것은 하나의 덩어리 건물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다섯 개의 유리 ‘렌즈(lenses)’(구조물)로 공원 위에 배치했다. 그리고 진짜 확장된 전시공간은 지하에 배치했다.
이 렌즈 구조물은 낮에는 자연광을 모아 지하 갤러리로 끌어들이고, 밤에는 은은히 빛을 내며 주변 풍경을 환하게 밝힌다. 지하 전시공간은 기존 건물의 폐쇄성과 달리, 빛과 공기가 흐르는 열린 공간으로 바뀌었다. 이때 핵심 역할을 한 것이 바로 “Breathing T’s”라는 구조 시스템이다. 이 장치는 단순한 환기구가 아니다. 유리 렌즈 아래의 곡면 구조와 맞물려 빛과 공기를 지하로 전달하면서, 동시에 구조 지지체와 설비 통로를 겸한다. 건축과 설비, 구조가 하나의 유기적 장치로 결합된 셈이다. 덕분에 지하 갤러리는 자연광과 환기를 확보하고, 공원과 실내가 호흡하듯 이어지는 공간 경험을 제공한다. 방문객은 지상의 산책로와 지하 갤러리를 오가며, 실내외의 경계가 풀린 새로운 연속성을 체험하게 된다.
지하를 여는 상상력과 기술의 조화
이 두 사례는 지상의 경관과 기억을 존중하면서도 지하를 전략적 자원으로 삼아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냈다. 지하는 단순한 부속이 아니라 도시가 선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무대였다.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기술과 상상력의 결합이다. 지반을 떠받치는 언더피닝, 상부 구조와 병행하는 탑다운 공법, 유리 구조물을 통한 자연광의 유입, 정교한 방수와 환기 시스템은 모두 그 결합의 산물이었다. 여기에 공간의 의미를 남기려는 건축가의 상상력과 디벨로퍼의 의지가 더해져, 새로운 전략을 탄생시킨 것이다.
지난 칼럼에서 다룬 리트로핏이나 적응적 재사용이 낡은 건축물을 되살리는 과정이었다면, 지상 보존과 연계된 지하 개발은 도시 차원의 전략으로 확장된다. 결국 성숙된 도시가 풀어야 할 과제는 더 높이 쌓는 일이 아니라, 무엇을 남기고 어디서 확장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이다. 한국의 재개발·재건축은 여전히 지상의 용적률 확대에 치중한다. 오래된 건물과 거리를 대할 때도 선택지는 대체로 두 가지다. 외형만 남기는 형식적 보존이거나, 흔적조차 없이 철거하는 방식이다.
보존과 개발이 병존하는 전략은 거의 시도되지 않는다. 그러나 위 두 사례는 보존과 개발의 병존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단순한 건축기술의 실험이 아니라 도시 전략의 전환이다. 한국에서 도시개발은 신개발이든 재개발이든 더 많은 용적률을 확보하는 것을 개발사업 최대의 목표로 삼는다. 용적률 상승이 곧 수익이라는 낡은 계산법 때문이다. 그러나 꼭 그렇지많은 않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도 더 높은 건물을 세우는 용적률의 게임에서 벗어나, 보존과 확장의 병존을 제도화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지하 개발을 제약하는 규제를 유연하게 풀고, 경관 보호구역에서 지하 활용을 허용하며, 지하 공간을 복합 기능의 플랫폼으로 승인하는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 지하는 더 이상 단순한 부속 공간이 아니다. 보존과 혁신이 만나는 또 하나의 무대이기 때문이다. 기술의 진보와 건축가의 상상력, 디벨로퍼와 시민의식이 어우러질 때 한국 도시도 철거와 신축의 낡은 이분법을 넘어설 수 있다. 지상은 기억을 간직하고, 지하는 미래를 여는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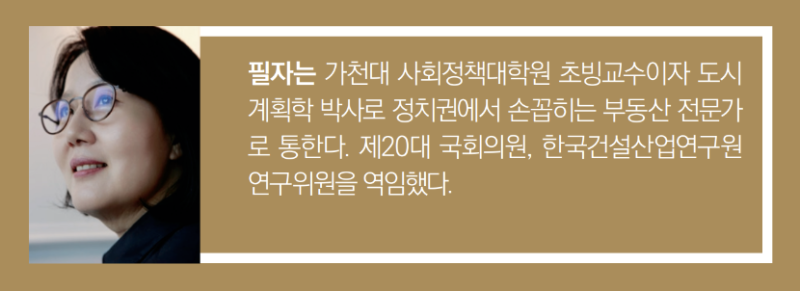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화에 샤넬, 루이비통 모양?"...올해도 보이는 '명품 장화', 얼마? [얼마예요]](https://image.economist.co.kr/data/ecn/image/2025/09/20/ecn20250920000018.400.0.jpg)
![직장인 취향 저격 햄스터가 있다?... AI ‘김햄찌’의 공감 드라마 [김지혜의 ★튜브]](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9/13/isp20250913000049.400.0.jpg)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브랜드 미디어
브랜드 미디어
1000가지 이상 질환 예측하는 의료AI 모델 나왔다[AI헬스케어]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이데일리
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숨지않고 당당해질 것”…김병만, 축복 속 재혼
대한민국 스포츠·연예의 살아있는 역사 일간스포츠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트럼프-시진핑, 내달 경주서 첫 대면…판 커진 APEC(재종합)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데일리
[마켓인]스타트업도 한류? 日고베시, 한국 스타트업 ‘정조준’
성공 투자의 동반자마켓인
마켓인
마켓인
김주희 인벤티지랩 대표 “마약중독 치료제, 필요시 추가 개발도 가능”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